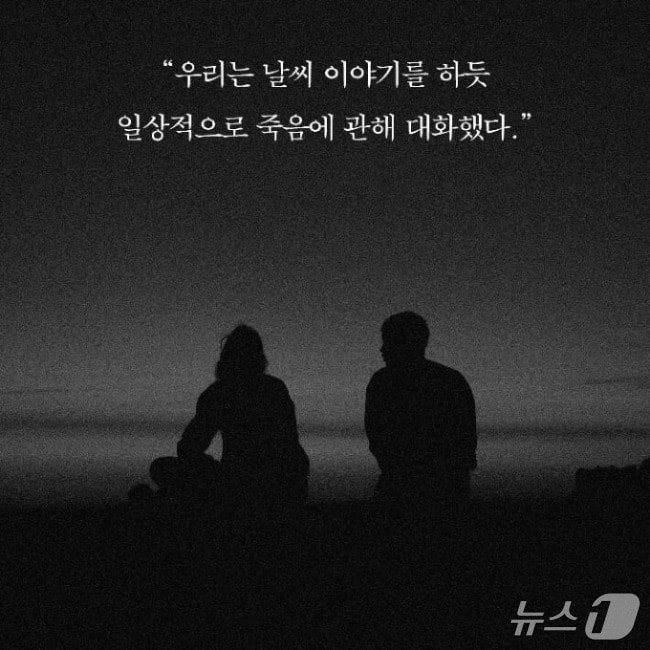
(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내가 죽는 날'은 조력 사망을 허용한 미국의 현장을 수년간 기록한 문화인류학자 애니타 해닉의 르포다.
저자는 죽음을 앞둔 이들의 선택을 동행하며, 고통과 연대, 그리고 마지막 결정의 의미를 치열하게 탐구한다. 그는 죽음은 단순한 종말이 아니라며 삶의 마지막에서 주도권을 되찾는 과정임을 설득력 있게 보여준다.
책에는 다양한 사례가 등장한다. 블루스를 사랑하는 90세 환자 켄, 삶의 마지막을 조력하는 전직 간호사 데리애나, 파킨슨병 활동가 브루스 등 조력 사망을 택한 이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죽음을 준비한다.
이들의 선택은 법 제도 바깥에서 인간 존엄성과 자기결정권에 대한 질문을 제기한다. 해닉은 죽음을 둘러싼 제도, 정서, 문화적 낙인의 층위를 깊숙이 파고들며, 존엄사의 의미를 다층적으로 풀어낸다.
책은 단지 죽음만을 다루지 않는다.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어떻게 인간답게 살 수 있느가라는 본원적 질문을 던진다.
자살과 혼동되는 조력 사망에 대한 오해, 제도 밖에서 죽음을 준비하는 이들의 고립, 의료 시스템의 한계 등 우리 사회가 회피해온 질문들이 책 전반을 관통한다. 동시에 죽음과 마주한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삶을 정리하고, 관계를 회복하며, 떠날 준비를 해나가는지를 따뜻하게 그려낸다.
저자는 조력 사망이 단지 약물을 통한 죽음이 아닌, 삶의 주도권을 다시 찾는 행위라고 강조한다. 환자가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이 누구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 그것이야말로 현대 의학과 사회가 놓쳐온 존엄의 본질이라고 말한다.
죽음이 개인의 결단이자 사회적 문제임을 명징하게 보여주는 이 책은, 웰다잉을 고민하는 이들에게도, 남겨진 이들을 위한 준비를 하고자 하는 이들에게도 묵직한 울림을 준다.
△ 내가 죽는 날/ 애니타 해닉 지음, 신소희 옮김/ 수오서재/ 2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