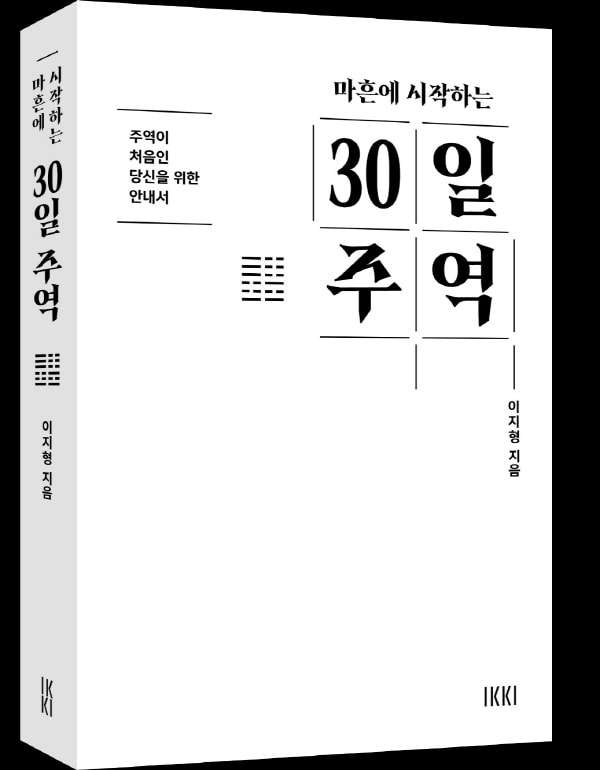 |
"그래서 주역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뭡니까?"
늦가을, 거리에 황금빛 낙엽이 지던 날이었다. 누군가 저자에게 물었다. 설악산을 한마디로 요약할 수 없듯 중중첩첩 쌓인 주역을 단 한 문장에 담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지형은 고민 끝에 한 문장을 꺼내 들기로 결심한다. "주역은 불안을 치유하는 책이다."
젊은 날, 이지형이 처음 주역을 만났을 때 그것은 '황홀하고 황폐한' 세계였다. 64괘의 질서는 투명하고 정갈했다. 삶의 무질서를 바로잡아 줄 것만 같았다. 몰입할수록 다른 속내가 드러났다. 2000~3000년 전 대륙의 혼란과 불안이 텍스트 전체에 스며들어 있었고 행간에는 황폐함이 가득했다. 늦가을 국화 같은 나이에 다시 만난 주역은 달랐다. 어지럽게 흩날리던 예언들 사이로 유장한 흐름이 드러났다. 변화에 대한 갈망, 낙관도 비관도 초탈한 삶의 지향이 보였다.
이지형의 신간 '마흔에 시작하는 30일 주역'은 그러한 재회의 기록이다. 30일간의 여정 동안 저자는 상투적인 고풍과 현학으로 오염된 주역을 씻어내고 주역의 살아있는 목소리를 되살린다.
흥미롭게도 이 책은 주역에 대한 양가적 태도를 솔직하게 드러낸다(278~293쪽). 저자는 학술지 '스켑틱'에 '주역을 믿어선 안 되는 7가지 이유'를 게재한 바 있다. 그런데 이 책의 말미에는 '주역을 믿어선 안 되는 7가지 이유'와 '주역이 아름다운 7가지 이유'가 나란히 배치되어 있다.
'주역을 믿어선 안 되는' 이유들을 보자. 서로를 비난하고 할퀴는 경(經)과 전(傳), 주역 텍스트가 '봉합'이라는 사실, 주역의 세계에 바다가 없다는 점, 주역이 지고지순한 연역의 체계가 아니라는 점, 미완성으로 끝맺는다는 설정의 허구, 임의적인 64괘의 배열, 음양이 과연 우주적 진리인가 하는 의문. 저자는 주역의 허점을 숨기지 않는다.
바로 그 허점들이 주역을 아름답게 만든다. '주역이 아름다운' 이유들은 이렇다. 중중첩첩, 세월을 쌓아 만든 텍스트, 낮과 밤의 흐름만으로 온 세상을 품는 절묘함, 우환의 끝에서 '걱정하지 않는다'는 낙관의 선언, '중심'을 배제하는 방랑적 사유, 직선적 세계관에 맞서는 '영원 회귀'의 발상, 광막한 우주에 너와 나를 던져 놓는 신비, 버려진 메시지들로 만들어 낸 또 하나의 우주.
저자는 말한다. 주역은 '봉합'이다. 서로 다른 시대, 서로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한데 모인 텍스트다. 경과 전은 서로를 비난하고 할퀸다. 64괘의 배열은 무질서에 가깝다. 바로 그 불완전함이 주역을 살아있게 만든다. 완벽하게 체계화된 이론이 아니라 삶의 복잡함과 모순을 있는 그대로 담고 있기 때문이다.
'중심을 배제하는 방랑적 사유'라는 표현이 인상적이다. 저자는 들뢰즈의 '리좀'(rhizome) 개념을 빌려 주역을 설명한다. 나무처럼 중심을 지탱하는 구조가 아니라 땅속줄기처럼 정처 없이 헤매는 구조. 64괘와 384개의 효가 어디에도 기대지 않고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주역의 모습이 바로 그렇다.
